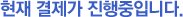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최병훈이 마련한 사색의 자리
최병훈의 작품은 겉보기엔 조각인지, 가구인지 단번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본 순간 묵직한 외관에 압도 당하고야 말죠. 가만히 감상하는 것 외엔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낯섬을 딛고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다가선다면 이제껏 누려본 적 없던 색다른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옆 길목에 큰 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 태연하게 놓인 돌들은 바다에 휩쓸려 매끈해진 자갈 같기도, 바둑돌 같기도 합니다. 그것의 근원과 쓰임을 짐작해 보던 중 그 곁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이가 돌 위에 사뿐히 앉는 모습을 마주치고야 맙니다. 그제야 그것이 ‘의자’가 될 수 있음을, 아니 ‘가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무심결에 앉아봤을지도 모르는 이 작품은 아트퍼니처의 대가인 최병훈의 작업입니다. ‘예술의 길, 사색의 자리’는 2007년 진행된 아트퍼니처 프로젝트입니다. 그의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겉보기엔 조각인지, 가구인지 단번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본 순간 묵직한 외관에 압도당하고야 말죠. 가만히 감상하는 것 외엔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낯섦을 딛고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다가선다면 이제껏 누려본 적 없던 색다른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 시절, 조선시대의 가구가 지닌 절제의 미덕을 실감했던 최병훈은 한국적인 미의식에 이끌려 가구에 입문하게 됩니다. 당시 가구는 사용자의 편의를 중시하여 최대한 실용적으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최병훈은 대량생산 되는 ‘가구’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관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자 가구와 예술의 결합을 시도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아트퍼니처’라는 개념이 전무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가구를 구현해내고자 거침없이 새로운 영역을 탐구했습니다.


그런 그가 천착했던 주제는 ‘중도의 미학’입니다. ‘중도’란 불교의 사상으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여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세이지요. 최병훈은 극과 극으로 여겨질 법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합일하는 방식으로 중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고자 연마했습니다. 가구의 형태에 미의식을 담는 것을 중히 여긴 그는 주재료로 ‘나무’와 ‘돌’을 택했습니다. 매끄럽게 가공한 나무와 거칠면서도 찬 기운을 지닌 돌.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을 이용하여,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구조에 긴장감을 더한 디자인을 선보였죠. 그렇게 탄생한 그의 대표작, ‘태초의 잔상’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태초의 잔상’은 그의 가구들을 지탱하고 있는 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청년 시절, 멕시코, 페루, 리비아 등을 여행한 그는 유적지 곳곳에 널려있던 자신의 몸집보다 큰 돌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비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육중한 돌을 보며 울림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돌은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를 목격하며 시간을 견뎌온 재료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돌은 이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기보단,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 말없이 그곳에 존재하죠. 최병훈은 자신의 작업이 “묵직하게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 자신의 뜻에 따라, 그의 작품은 불필요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공간의 여백을 자연의 기운으로 채웁니다.


아트퍼니처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가구에 작가의 창조성을 더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퍼니처 앞에, ‘아트’라는 단어만 덧붙었을 뿐인데 왜인지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작가는 그의 작품이 생활과 극도로 밀착하거나 단지 휴식의 기능으로서만 쓰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선사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그런 그의 작품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낀 채로, 전시된 조각 작품을 보듯이 감상합니다. 최병훈은 한 인터뷰에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물건이 예술적인 감각까지 전달한다면, 그 물건과 일상은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구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도 그 자체로서 오브제로 기능하길 바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내 앞에 차분히 놓여있는 가구를 통해 위안을 얻길 고대했죠. 그래서일까요? 거대한 자연 앞에 설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듯, 최병훈의 작품을 보고 있자면 저절로 입을 굳게 다물게 됩니다.

감상이 끝난 뒤에는 그 위에 살며시 앉아 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작품과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의 작품 위에 앉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병훈이 만드는 의자나 벤치는 대부분 등받이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마음 편히 기대기엔 쉽게 이를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 위에 앉을 땐 배에 힘을 준 채 바른 자세로 앉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자세를 유지한 채로 있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듯합니다. 가지런한 숨을 내쉬는 사이, 시선은 몸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극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몸에 힘을 조금 풀고 팔짱을 끼며 구부정해진다던가, 팔을 뒤로 뻗어 의자를 짚은 채 천장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도 어딘가 불편하다 싶어지면 결국 처음의 자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최병훈의 작품을 감상할 땐, 필연적으로 긴장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작품이 사색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건강한 사유를 하기 위해선 온몸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아야 합니다. 좋은 자세에 좋은 생각이 깃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앉는 행위를 통해 작품과 내가 겹칠 즈음, 자세를 바로잡을 때, 적당한 거리가 생기는 순간에야 새로운 감상이 시작됩니다.
그가 만든 의자를 보며 ‘장인의 자세’를 떠올려봅니다. 꼿꼿한 몸으로 중도를 걸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 작품을 만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의자에 앉는 순간 우리는 느슨한 일상을 돌아보고 이를 바로 잡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최병훈의 작품을 마주친다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머물러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 작가가 마련한 사색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그것이 의자가 될 수 있음을, 아니 특별한 가구임을 실감하게 될 테니까요.